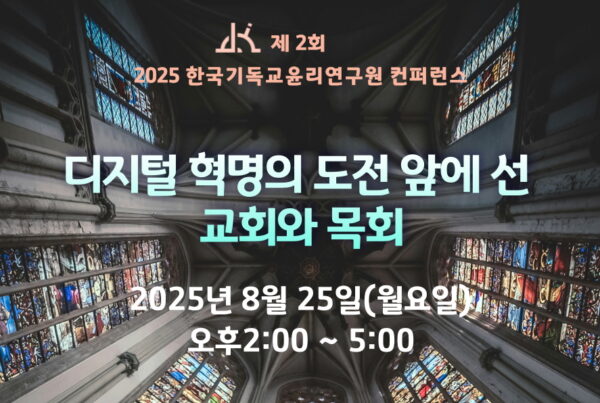I. 서론: 알파고 쇼크, 10년 후의 우리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을 꺾은 그날,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지적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목격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당시의 충격을 기록하며,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 보급되면 소설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봤다”고 술회한다.[1] 그의 통찰처럼, 이제 AI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환경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장강명은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환경 그 자체일 것”이라고 예견했다.[2]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미 다가온 디지털 미래’의 한복판에 서 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행정과 목회 자료 분석, 심지어 신앙 상담의 영역까지 넘보는 현실이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 변혁 앞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윤리적 좌표를 설정해야 할까? ‘AI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순진한 낙관론이나, 기술 자체를 적대시하는 막연한 공포심을 넘어, 우리는 보다 깊고 정교한 신학적, 윤리적 성찰의 과제 앞에 서 있다.
‘디지털 혁명’의 도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위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먼저 장강명의 통찰을 빌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어서 AI 기술이 제기하는 신학적 질문들, 특히 ‘우상숭배’의 위험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고유성의 문제를 짚어볼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외 복음주의권에서 제시된 AI 윤리 원칙들을 종합하여 실천적인 분별의 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의 미덕 윤리를 통해 AI의 기능적 유용성과 인간 고유의 ‘참된 미덕’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이 시대 교회와 목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여정은 기술을 통제할 방안을 넘어, 기술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는 신앙적 순례가 될 것이다.
II. 거스를 수 없는 현실: ‘먼저 온 미래’의 통찰
장강명 작가는 바둑계를 통해 AI가 하나의 산업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3] 그의 통찰은 교회와 목회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서늘한 현실 인식을 제공한다.
첫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알파고 이후 신진서 9단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스승으로 삼”은 첫 세대가 되었다.[4] 이는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가치판단과 탁월성의 기준 자체가 AI에 의해 재설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설교 준비, 성경 공부 자료 제작, 교회 행정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목회자는 그렇지 않은 동료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오를 것”이다.[5] AI가 문학계에 대해 미칠 영향을 장강명이 예언하면서,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문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같은 한가한 고민을 할 여유는 사라”[6]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문제는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AI가 재편하고 있는 목회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이다.
둘째,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다. 장강명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들의 순진한 전망은 틀렸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고 뒤바뀐다.”[7]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SNS가 만들어낸 소통 방식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 AI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의미 자체를 바꾼다. 가령 ‘탁월함’이라는 가치를 생각해보자. 과거 탁월한 설교란 깊은 묵상과 신학적 통찰, 청중에 대한 이해가 어우러진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AI가 더 논리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담은 설교 초안을 순식간에 만들어낸다면, ‘탁월함’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 장강명의 질문처럼, “탁월함을 첫 번째 목표로 추구하지 않을 때 예술은 무엇이 될까?”[8]라는 질문은 “탁월한 영성을 추구하지 않을 때 목회는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셋째,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장강명은 “쓸모 있고 강력한 기술은 마치 야수와 같다”며 “일단 거리에 뛰쳐나오면 붙잡아 우리에 가두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경고한다.[9] 지금은 제약이나 건설업계처럼 최소한의 공적 관리 체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기술 기업들이 AI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기술 발전이 곧 인류의 발전이라는 ‘기술 사상’을 설파하지만, 장강명은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외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일침을 놓는다.[10]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낳고, 기존의 가치를 훼손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 ‘야수’가 우리와 양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가치의 근원에 대한 문제,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장강명은 “현대의 사상가”로 명명한다.[11] 목회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신학적, 윤리적 분별력을 갖추어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AI 시대 현대의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
III. 신학적 성찰: 현대판 우상과 하나님의 형상
디지털 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신학적 질문을 건드린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윤리를 세울 수 없다.
1. 새로운 우상, 거짓된 안식처로서의 AI
성경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다(출 20:4). 시편과 예레미야가 묘사하듯,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금과 은의 조각상이었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권력욕과 통제욕’을 투사하는 대상이었다.[12] 인간은 우상을 통해 신을 조종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는 ‘현대판 우상’이 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한다. AI는 놀라운 효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 심지어 지적인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겠다고 속삭인다.[13] 복잡한 목회 데이터 분석으로 교회 성장의 해법을 제시하고, 지친 성도에게 24시간 맞춤형 위로의 메시지를 건넬 수 있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무비판적으로 기댈수록,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예측 가능한 결과와 통제 가능한 효율성을 더 의지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신학적 통찰은 여기서 더욱 중요해진다.[14]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사랑, 정의, 관계, 자비) 대신 AI의 가치(효율성, 계산, 통제, 속도)를 숭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차가운 계산과 효율로 채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I 기술 기업들이 제시하는 유토피아적 미래의 약속 앞에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번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로 이끄는 거짓된 안식처는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
2. 기계 너머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재확인
AI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능가하는 현실은, 인간을 복잡한 기계나 정보 처리 장치로 보려는 유물론적 환원주의를 강화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인간의 고유성과 존엄성은 지적 능력이나 계산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이하 ERLC)가 발표한 「인공지능: 복음주의 선언」(Artificial Intelligence: An Evangelical Statement of Principles) 제1조는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내재적이고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 도덕적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음을 확신한다.”[15]
즉,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relationality),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stewardship),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모방할 수는 있다. 그러나 AI는 영혼을 가질 수 없으며,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16] AI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거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 깊은 슬픔에 잠긴 교인에게 AI 챗봇이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목회자의 손길이 주는 진정한 위로와 영적 교감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AI의 발전은 인간 고유성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질이 지성이나 기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IV. 기독교 윤리적 분별을 위한 5가지 가치와 3가지 원칙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떻게 분별하고 사용해야 할까? 미국의 ERLC 선언문 등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우리에게 유용한 분별의 틀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여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가치와 3가지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AI 윤리를 위한 5가지 핵심 가치
① 인격으로서의 번영 (Human Dignity): AI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인간을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대출이나 채용을 최종 결정하고 투명한 설명 없이 거절한다면, 이는 인간을 인격이 아닌 데이터의 집합으로 취급하는 것이다.[17]
② 관계 안에서의 번영 (Relationality): AI는 인간의 진정한 관계를 대체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 돌봄 로봇이 외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을 대체하여 관계의 진정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성적인 쾌락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위이다.[18]
③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기 (Justice & Solidarity): AI는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 교회는 AI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19]
④ 창조 세계 돌봄 (Creation Care): AI 개발과 운영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이 소모된다. 우리는 AI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나 환경 파괴를 유발하지 않도록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20]
⑤ 공동선에 기여 (Common Good): AI 기술로 인한 이익이 소수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사회적 격차를 키워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공동선을 해쳐서는 안 된다.³⁸ 개인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없다.³⁹
2. AI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3가지 책임
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사용자는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인간 중심 설계 및 인간의 개입 보장 (Human-centricity & Human Oversight): 모든 AI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중요한 결정 과정에는 항상 의미 있는 ‘인간의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⁴⁰
② 책임성 (Accountability): AI 알고리즘이 오작동하거나 해로운 결과를 낳았을 때, 그 책임은 기계가 아닌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한 인간에게 있다. ERLC 선언문이 명시하듯, “인간만이 도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21]
③ 투명성 (Transparency): AI가 의사결정에 사용될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그것이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V. 기능적 유용성을 넘어: 참된 미덕의 길
AI 윤리 원칙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드레일을 제공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금지 목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선’이란 무엇이며, ‘참된 미덕’이란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18세기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통찰은 AI 시대에 놀라운 적실성을 보여준다.
에드워즈는 『참된 미덕의 본질』(The Nature of True Virtue)에서 ‘참된 미덕’(True Virtue)은 ‘존재 일반에 대한 호의적 사랑’(benevolence to Being in general)이라고 정의했다.[22] 이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 그 사랑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 흘러가는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disposition)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된 미덕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 근원이 ‘마음’(heart)에 있다. 외적인 행위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참된 미덕이 아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셋째, 이 참된 미덕은 ‘이차적 아름다움’(secondary beauty)과 구별된다. 질서, 조화, 효율성, 또는 부모의 자식 사랑과 같은 본능적인 애정 등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참된 미덕이 아닌 ‘이차적 미덕’에 불과하다.
이 에드워즈의 틀을 AI에 적용해 보자. AI는 놀라운 ‘이차적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화로운 음악을 작곡하며, 논리 정연한 글을 생성한다. 심지어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시뮬레이션하여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AI는 결코 ‘참된 미덕’을 소유할 수 없다. AI에게는 미덕의 좌소인 ‘마음’과 ‘영혼’이 없다. 그 모든 행동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기반한 계산의 결과일 뿐, 사랑이라는 내면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AI는 신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로 인한 영적인 변화는 피조된 인간에게만 허락된 신비이다. AI는 ‘존재 일반’, 즉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AI의 ‘호의’는 언제나 제한된 목표(프로그래밍된 목적)에 묶여 있으며, 결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보편적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AI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용한가?’를 넘어 ‘무엇이 참으로 아름다운가?’를 묻게 한다. AI가 제공하는 기능적 유용성과 효율성은 ‘이차적 미덕’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참된 미덕’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즉,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VI. 결론: 교회와 목회를 향한 제언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디지털 미래 앞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언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두려워 말고 분별해야 한다. ERLC 선언의 서문처럼, “우리는 미래나 어떠한 기술 발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23] 두려움은 무지와 무기력으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는 본고에서 제시된 신학적, 윤리적 틀을 가지고 기술의 실체를 냉철하게 분별하며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둘째, 온전한 인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AI가 인간을 기능과 데이터로 환원하려는 시대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힘써 외쳐야 한다. 우리는 지능이나 유용성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선포해야 한다.[24] 또한 기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구원론에 맞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증거해야 한다.
셋째, 참된 미덕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AI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 ‘관계적 깊이’와 ‘참된 사랑’이다. AI가 효율적인 정보와 시뮬레이션된 위로를 제공할 때,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웃어주는 진정한 교제, 비효율적이더라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인내, 계산 없이 베푸는 환대와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장강명이 우려했던 ‘사연 많은 직장인 아마추어 관현악단’의 연주가 베를린 필보다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기교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성 때문일 것이다.[25]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의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툴지만 진실한 사랑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회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AI 개발의 윤리적 기준,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의 투명성, 기술로 인한 불평등 해소 등의 문제에 대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며, 정부와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26]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발밑에 차올랐다. 이 파도 앞에서 우리는 표류할 수도, 혹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 선택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다. 부디 한국교회가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희망을 발견하고, 기술의 빛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성호. “AI와 인간 고유의 미덕: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덕 윤리를 중심으로.” 「제 48차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안양: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025: 59-64.
______. “사회이슈#3. AI 시대의 기독교 윤리와 신학적 성찰.” 「고신뉴스 KNC」. 2023년 10월 17일.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29.
장강명. 『먼저 온 미래: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서울: 동아시아, 2025.
[외국 문헌]
Edwards, Jonathan. The Nature of True Virtue. 정성욱 역. 『참된 미덕의 본질』.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 Evangelical Statement of Principles.” April 11, 2019. https://erlc.com/resource-library/statements/artificial-intelligence-an-evangelical-statement-of-principles/.
Vatican. 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and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Antiqua et nov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Intelligence.” 28 January 2025. [https://www.etnews.com/20211004000072](https://www.etnews.com/20211004000072).
각주
[1] 장강명, 『먼저 온 미래: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서울: 동아시아, 2025), 25.
[2] 장강명, 『먼저 온 미래』, 113.
[3] 장강명, 『먼저 온 미래』, 25.
[4] 장강명, 『먼저 온 미래』, 69.
[5] 장강명, 『먼저 온 미래』, 79.
[6] 장강명, 『먼저 온 미래』, 79.
[7] 장강명, 『먼저 온 미래』, 187.
[8] 장강명, 『먼저 온 미래』, 251.
[9] 장강명, 『먼저 온 미래』, 107.
[10] 장강명, 『먼저 온 미래』, 298-99.
[11] 장강명, 『먼저 온 미래』, 338-39.
[12]강성호, “사회이슈#3. AI 시대의 기독교 윤리와 신학적 성찰”, 「고신뉴스 KNC」, 2023년 10월 17일,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29.
[13] Vatican, 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and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
[14] G. Beale, We Become What We Worship: A Biblical Theology of Idolatry (InterVarsity Press Academic, 2018), 12.
[15]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 Evangelical Statement of Principles,” (April 2019), Article 1.
[16]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
[17]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
[18]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6.
[19]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5.
[20] Vatican, “Antiqua et nova,” par. 96-97.
[21]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3.
[22]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미덕의 본질』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23. 강성호, “AI와 인간 고유의 미덕: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덕 윤리를 중심으로”, 「제 48차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안양: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025), 59-64.
[23]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Preamble.
[24]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1.
[25] 장강명, 『먼저 온 미래』, 251.
[26]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cle 11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의 연구위원인 강성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공군학사장교 기상예보관으로 근무한 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미국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철학적 도덕적 신학과 조직신학으로 Th.M, 캐나다 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Christian Theology(Theoligical Studies- 세부전공 기독교윤리)로 Ph.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