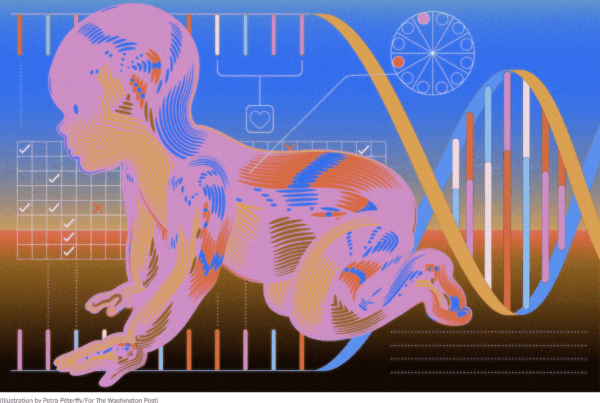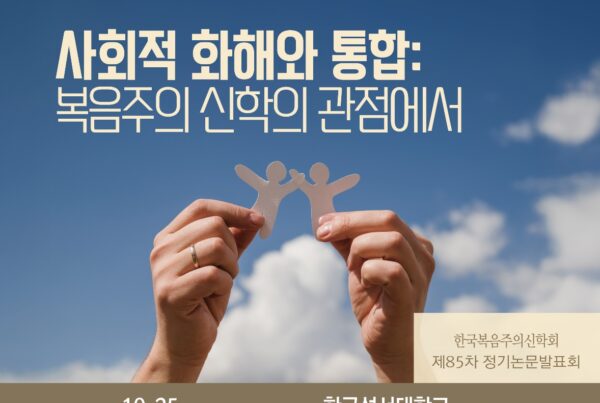요즘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다. 넷플릭스에서 지난 3월 7일 공개된 16부작 “폭싹 속았수다”다. 박보검, 아이유, 문소리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방영 전부터 흥행이 예상되었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배우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하면서도 몇 주 동안 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드라마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다. 결국 비영어권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작품을 외면할 수 없었고, 마침내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다. 과거의 향기랄까. 그 익숙함은 바로 이 드라마를 연출한 김원석 PD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미생(2014)”, “나의 아저씨(2018)”를 연출한 감독이었다. 나의 아저씨를 보았을 때, 나는 이런 글을 남겼다.
요즘 나의 아저씨는 내 눈물샘을 자극하는 유일한 드라마다. 배우들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실제 같은 느낌을 주고, 슬픔을 일상이라는 그릇 안에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마치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적당히 잘 삶아진 라면처럼.
아이유(이지은),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배우와 더불어, 국민 아저씨가 될지도 모를 내 또래 배우 이선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아저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아저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도 생긴다.
아저씨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언어다. 마을 안에서 친척은 아니지만 남도 아닌, 의지할 수 있으면서도 책임감이 요구되는 존재.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도 아직 마을의 아저씨를 떠올릴 수 있는 세대가 아마 우리 40대 일 것이다. 골목마다 아저씨가 있었고, 이들은 가끔 무서운 형들의 방패가 되어 주기도 했으며, 가게에서 사탕을 사주던 다정한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마을이 해체되면서 이런 아저씨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저씨를 경계하고, 피해야 할 존재로 배우고 있다. 개인이 강화되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등장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드라마는 전통적이면서도 친절하고 윤리적 책임감을 지닌 아저씨의 모습을 되살린다. 그것이 우리의 잊혀져 가는 공동체와 그 안의 향수, 윤리를 소환하기에 마음이 짠하다.
아!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아저씨’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예수 아저씨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들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말로 ‘아저씨’라고 부르며 다가오던 아이들. 예수 아저씨는 아이들의 친구였을 것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제목만 듣고 사기꾼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란다.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정서가 새삼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문학 소녀였던 애순,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꿈꾸던 청춘의 이상을 기꺼이 희생한 부모님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 세대의 늦은 감사 인사가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드라마를 보다 보니, 나의 아저씨 속 ‘아저씨’가 이 작품에서는 ‘아줌마’로 다시 태어낳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해, 어린 애순이의 곁을 지켜준 해녀 아줌마들. 죽은 아버지의 가족에게도, 새아버지의 가족에게도 딱히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애순이지만, 바닷물에 젖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고, 바람을 막아 서서 감싸 안아준 건 동네 해녀 아줌마들이었다. 결혼하고 멀리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애순이 소식은 들었나?” 서로 안부를 물으며, 그 아이를 챙겼다. 어쩌면 애순이는 부모를 잃었지만, 바닷속을 누비던 해녀 아줌마 공동체가 부모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아직 드라마는 절반이나 남아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애순이의 해녀 아줌마들…
교회의 아저씨들과 아줌마들은 어디에?
이쯤에서 문득 우리 교회에는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대부와 대모를 둔다. 말 그대로 ‘아빠를 대신하는 분’, ‘엄마를 대신하는 분’이라는 뜻이다.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었다. 성공회와 루터교는 여전히 대부(Godparents) 제도를 지키고 있지만, 장로교와 침례교를 비롯한 개혁파 교단들은 이를 두지 않는다. 성경에 없는 제도를 성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부모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역할을 특정한 몇 사람이 맡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저씨’와 ‘아줌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안의 애순(“폭싹 속았수다”의 여자 주인공)이와 지안(“나의 아저씨”의 여자 주인공)이를 외롭게 두지 않고 보듬어 주는 것, 각자도생(各自圖生)이 미덕과 윤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등불과 소금,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공동체라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도 피난처로 충분하지 않을까?

한기윤 선임 연구위원인 이춘성 박사는 20-30대 대부분을 한국 라브리(L’Abri) 간사와 국제 라브리 회원으로 공동체를 찾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환대 사역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다. 고신대에서 “포스트모던 환대 윤리 사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독교 환대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연구”로 기독교 윤리학 Ph.D. 를 하였다. 현재 분당우리교회 협동 목사, 한기윤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