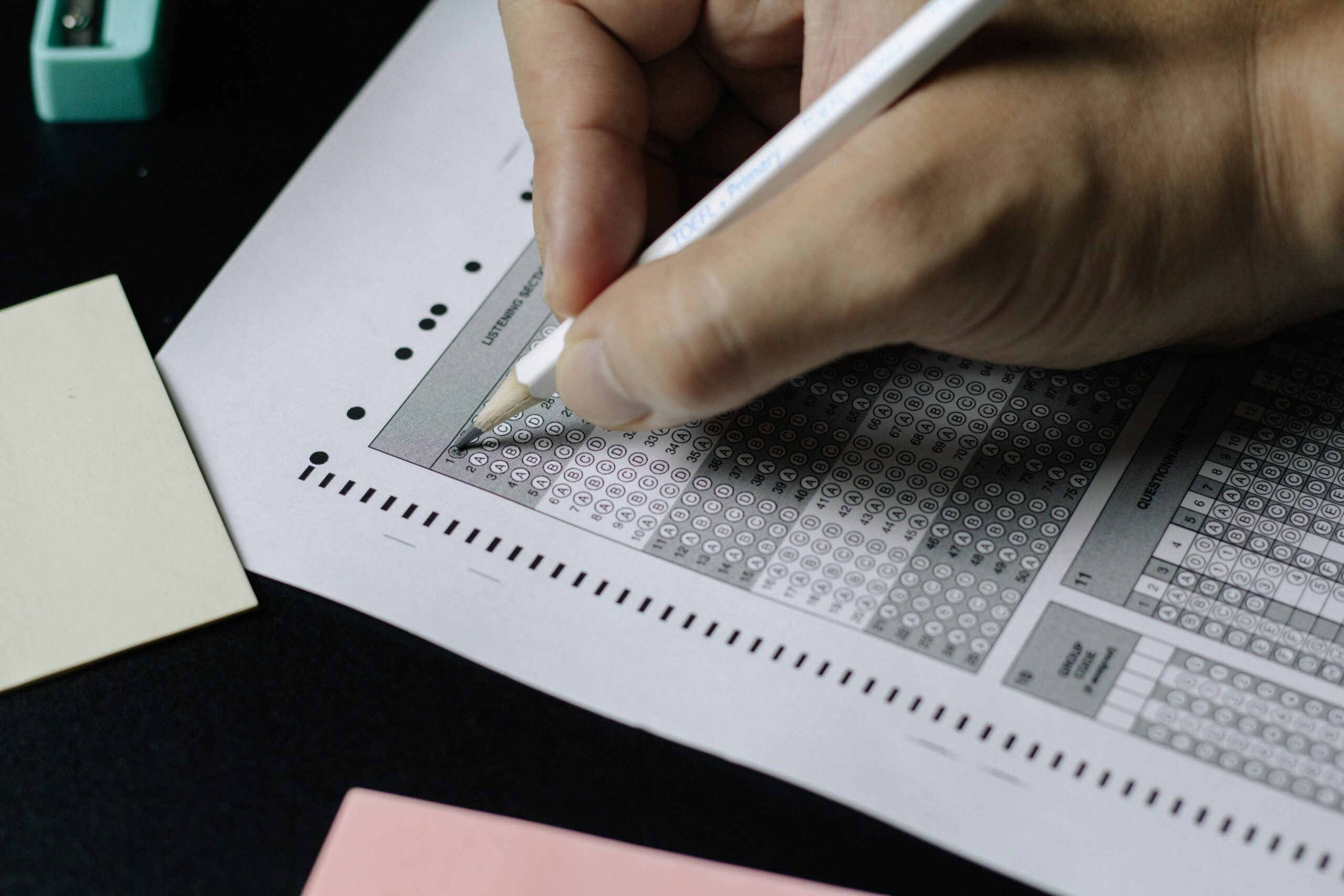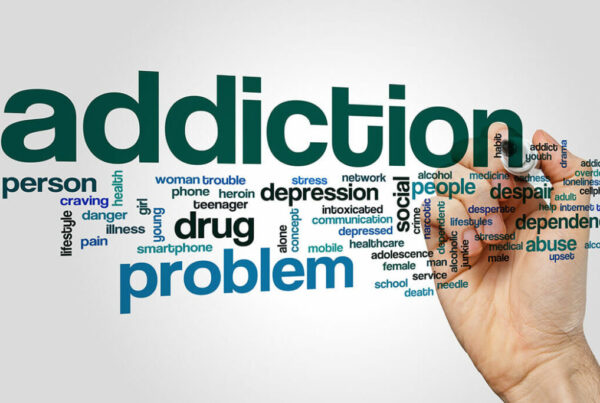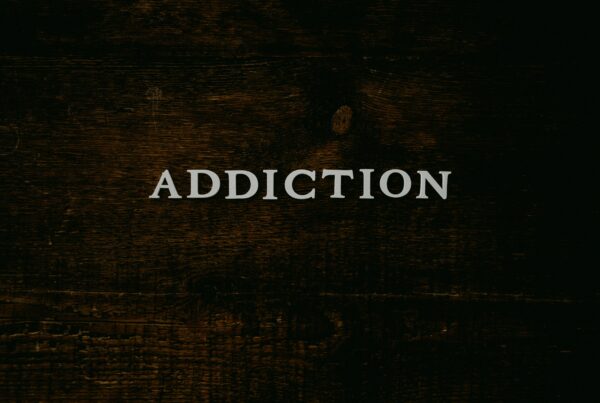1.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본질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제 교육은 개인이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묻기보다는, 점수를 위한 기계적인 암기와 반복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뿌리를 이루는 철학과 세계관의 왜곡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결국, 교육의 위기는 세계관의 위기이기도 하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결정한다고 말하며,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운 일이 있다.[1]
오늘날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체계는 개인의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주의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지식은 도구적 가치만을 지니게 되고, 학습자는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점차 흐려진다. 교육학자 이비(C. B. Eavey)가 말했듯,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다.[2]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비판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독교 교육 철학이 제시하는 대안적 교육관을 모색하며, 성경에 뿌리내린 인식론과 지식관, 그리고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특히 11월 입시철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특별한 목회적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정시와 수시 전형이 본격화되면, 교회의 많은 청년들과 그 부모들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깊은 고민과 불안에 직면한다. 어떤 학생은 기대 이상의 성적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만, 또 다른 학생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과 자괴감 속에 머무른다. 부모들 또한 자녀의 입시 결과를 앞에 두고 안도하거나 염려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물음 앞에 선다. 이 시기, 교회 목회자들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존적이고도 구체적인 무게를 지닌다.
“목사님, 아이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제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의대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의대를 선택해야 할까요?”
“재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대학에 만족해야 할까요?”
이러한 물음 앞에서 목회자는 그저 위로와 격려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분명한 목회적 관점과 지침이 요청된다. 이 글은 교육 철학과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입시철을 맞이한 목회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상담 지침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교육과 입시 현실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탈(脫)인간적인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학습자들을 서열화하는 데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정점으로 하는 입시 체제는 아무리 보완적 방안을 고안하려고 시도할지라도 결국 학생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한 줄로 세운다. 일례로 지난 해 이과 학생 중에 전국 수석부터 3058등까지 전부 의대(醫大)에 진학했으며 수시 모집에서도 내신 평균 등급이 1.0등급인 자연계열의 학생들 중에 86%가 모두 의대에 지원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관심과 무관하게 상위권은 전부 이과로, 이과 중에서도 의대에 현격하게 쏠려 있다. 이러한 의대 쏠림 현상은 교육이 지닌 본연의 목적인 학습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형성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한국의 교육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얼마나 타인과의 경쟁과 승리를 수단으로 왜곡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 교육이 수반하는 무수한 폐해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이 획일적 평가 기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된다. 둘째, 협력과 공동체 의식보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배타성이 조장된다. 셋째, 과정보다는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각 개인의 고유함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명백한 반기독교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빚어내는 더 큰 문제는, 현대 한국 교육이 지식 그 자체의 본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은 이제 삶의 깊이를 더하거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는 고귀한 목적보다, 입시와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덕을 기르고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산출해내는 효율적 도구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독한 도구주의적 지식관은 실용주의와 물질주의가 결합된 세속적 세계관의 산물이다. 실제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가능성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된다. 문학 작품은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르쳐지고, 역사는 삶의 교훈을 얻기 위한 성찰의 장이 아니라 암기해야 할 사실 목록으로 축소된다. C. S. 루이스는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을 정글 속 세상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라고 말했다.[3]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육은 학생들을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과 타락한 세상의 자녀로 길러내는 일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일반 교육에서 공부하는 수학, 과학, 문학 등의 다양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은 그 바른 방향을 잃은 채, 개인과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이익과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은 그 울타리를 넘어선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며, 창조 세계를 깊이 있게 껴안는다. 지식은 결국 사랑을 향한 여정이어야 한다.
3.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 바라보기
기독교 교육은 무엇보다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제시하는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원리에 근거한다.[4]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인간 존재의 영역은 한 치의 범위도 없다”고 선언하며 교육 영역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커리큘럼에 종교 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과 교육 활동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은 교육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해하며,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 특히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타락-구속(Creation-Fall-Redemption)의 구속사적 틀을 통해 현실을 이해한다. 교육 또한 이 틀 안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
창조
첫째, 창조의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와 의미로 충만하며, 이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창조주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학문적 탐구는 그 자체로 거룩한 활동이다.
타락
둘째, 타락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식능력과 교육 활동은 죄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인간은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는 교육에서도 인본주의적, 자율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극복하고 만물을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회복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구속
셋째, 구속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교육의 참된 목적과 방향이 회복된다. 기독교 교육은 학습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여정을 걷게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지식은 분절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모든 이론적 사고가 종교적 전제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중립적 학문이나 세속적 지식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5] 도예베르트는 또한 이론적 사고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으며 모든 이론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종교적 뿌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에서는 모든 과목과 지식 영역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수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내재된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과학은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탐구하는 활동이며, 문학과 예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모든 지식은 계시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는 두 흐름으로 나타난다. 일반계시는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흔적이며, 특별계시는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진리이다. 참된 기독교 교육은 이 두 계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는 노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성경을 ‘안경’에 비유하며, 성경의 빛 아래서만 자연과 역사, 인간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7] 이는 곧, 성경이 기독교 교육에서 단순히 종교 과목의 교재가 아니라, 모든 학문과 지식을 해석하는 최종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칼빈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인간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신학과 인문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8]
기독교 전통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나 기술의 연마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wisdom)이며, 그 지혜는 삶의 깊은 근원으로부터 우러나온다. 구약의 지혜문학, 특히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라 선언한다. 이는 모든 참된 지식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함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지혜 중심의 교육관은 오늘날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정보 중심, 기술 중심 패러다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가 강조했듯이, 교육의 참된 목표는 책임감 있는 행동(responsible action)에 있다.[9] 참된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책임감 있게 ‘섬기도록’ 이끄는 일이어야 한다.
5. 한국 교육에 기독교 교육이 답하다
사랑의 방향성 회복을 위한 교육
기독교 교육이 오늘날 한국 교육 현실과 마주하여 시급히 응답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 기초한 ‘전인적 인간 형성’에 대한 요청일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어우러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본다(살전 5:23).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은 인간 존재의 전 영역-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이 균형 있게 자라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 교육이 인지적 능력, 곧 머리로 아는 것에만 치우친 모습과 선명하게 대조된다. 기독교 교육은 지적 능력의 계발은 물론이고, 정서적 성숙, 사회적 책임감, 도덕적 판단력, 영적 깊이,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 전체를 품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 가운데서도 ‘영성’의 영역은 세속 교육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기독교 교육만의 고유한 빛이다. 제임스 K. A. 스미스(James K. A. Smith)는 인간이 단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그 사랑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어야 한다.[10]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
나아가 기독교 교육은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개인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성화를 통해 이 땅 위에 조금씩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존 칼빈이 말했듯,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11] 이처럼 기독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구조 위에 세워진 한국 교육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기독교 교육 공동체는 학생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우며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실천하고,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은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개발하도록 이끈다.
소명을 향한 교육
다음으로 기독교 교육에서 진로는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에 대한 응답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에 따르면, 모든 정당한 직업과 사회적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며, 따라서 각자의 삶은 거룩한 사명을 갖는다.[12] 이러한 소명 중심의 진로 교육은 현재 한국 사회의 직업 서열 의식과 물질주의적 성공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다. 기독교 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 농부, 교사, 의사, 사업가, 정치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과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삶의 종합적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배우는 것이다. 지난해 이과 상위 1등부터 3058등까지 의대에 진학한 아이들 중에 분명 교회와 기독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소명 의식을 갖고 진정으로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의대에 진학했을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선택하는 진학과 진로가 단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생존주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욕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실제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6. 입시철 학생들을 위해 교회와 부모들이 고민해야 할 것들
기독교 교육이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지니는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11월 입시철을 맞이한 목회자들이 학생과 부모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입시의 결과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든, 반대로 우수하든, 인간의 가치는 결코 시험 점수나 대학의 이름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 성경적 진리를 목회자는 거듭해서 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입시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주어진 지금의 자리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보여주듯,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힘이다.
특히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단순히 ‘더 좋은 대학’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동기를 함께 묻고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재수의 결정은 곧 자신의 소명과 방향을 되짚어보는 신중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려 하는지, 이 과정이 정서적이며 영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돕는 것이 목회의 역할이다.
학부모와의 상담에서도 목회자는 자녀를 향한 조건적 사랑, 그리고 학벌 중심의 세속적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의 미래는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입시의 결과와 무관하게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다. 또한 학벌주의에 사로잡혀 사회적으로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길이 타인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비교보다는 자녀의 고유한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격려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입시 결과 앞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신앙 안에서 자녀를 지지할 때, 자녀 또한 성적과 대학이라는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를 바라보게 된다. 목회자는 부모가 기도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모든 정당한 직업 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 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학생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입시의 계절에 목회자가 전해야 할 참된 위로와 방향의 메시지일 것이다.
7. 나가는 말
글을 맺으며, 다시 한번 11월 입시철을 맞이한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 결과 앞에서 흔들릴 때, 목회자는 성경적 소명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전해야 한다. 학벌주의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과 삶의 통합을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목회자는 “모든 정당한 직업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 입시 결과에 좌절하는 학생에게는 “너의 가치는 시험 점수나 대학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세속 교육의 위기는 곧 기독교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세속적 교육 패러다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참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때, 한국 교육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 것이다.
각주
- Francis A. Schaeffer, How Should We Then Live?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1976), 19-20.
-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p. 11.
- C. S. Lewis, The Abolition of Man (New York: HarperCollins, 1944), 4-5.
- Westminster Assembly.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2nd ed.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1946), Q. 1.
- Herman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2 vol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4), 73-74.
- Herman Dooyeweerd, Roots of Western Culture: Pagan, Secular, and Christian Options, trans. John Kraay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9), 61.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6.1.
- Institutes, I.1.1.
- Nicholas Wolterstorff,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ed. Clarence W. Joldersma and Gloria Goris Stronk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4), 22.
- 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40.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2.8.51.
- Abraham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rans. Henri De V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31), 455–456.

이동열 교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M.Div.를 나와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M.A.C.E.와 기독교교육학 Ph.D. 학위를 받았다. 성서유니온선교회에서 어린이매일성경과 청소년매일성경 편집자로 일하였으며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이며 더샘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